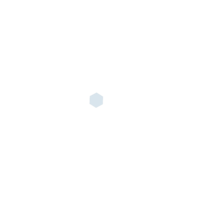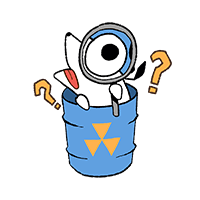싱숭생숭
- 241 조회
영화에서 만화
만화에서 소설
소설에서 게임
게임에서 애니메이션
이 순서로 컨텐츠를 접해왔습니다.
제대로 생각이 굳은 뒤로 기준을 잡으면 이렇고,
아마 유아용 만화라거나 이런건 기억나지 않는 저편에서 접했던 경험이 있겠지요.
어쨌든 그 중 가장 의미있었던 작품 두개를 꼽으라면,
바람 계곡의 나우시카
다크 소울
이 두개를 항상 꼽습니다. 우습게도 각각 두 명의 다른 미야자키 감독이 만들었죠.
위 작품들은 인간과 문명, 자연의 조화를 시사하며 그 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룹니다.
그 주제는 그대로 저에게 스며 제 인생동안 밝히고싶은 의문으로 남았습니다.
제게 문화는 컨텐츠 이상의 무언가입니다.
그리고 그렇기때문에 때로는 가차없이 누군가의 결과물을 깍아내립니다.
그저 유흥에 불과해 전달하는 바가 없다면 그것의 존재 의의는 없다. 뭐 이런 논리이지요.
문화는 무용합니다.
누군가를 배부르게하지도,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.
하지만 그렇기에 탐욕과 본능에 지배당하지 않는 순수한 전달을 해낼 수 있습니다.
그게 문화의, 펜의, 교양의 힘입니다.
하지만 그저 컨텐츠라면, 그 전달이 비어있다면 땅따먹기와 다를바 없겠지요.
승리의 의미도, 패배의 의미도 없는 그저 시간 죽이기.
술래잡기처럼 생존에 도움을 주는 훈련조차 되지 못하는 '그저 놀이'입니다.
전달하는 바가 오롯이 스스로
또렷이 존재해야 비로소 그 존재 가치를 입증한 '작품'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.
물론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며, 전달하는 바가 '없음'임을 강조하는 오락적 작품또한 존재합니다.
(ex: 영화는 존 윅, 게임은 둠이 대표적입니다.)
그런 '작품'을 위해 공부하게된 계기가 다크소울 이었습니다.
그저 오락이 아닌 진짜 무언가
그리고 그것을 말초적 카타르시스와 모험감으로 포장해 부담없이 그 전달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.
비록 게임과 관련된 진로는 상당히 비참한 이유로 포기했지만,
그 진로의 목적인 '작품을 만들자'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
그렇기에 쉽사리 인정받기 힘든, 어찌보면 대중성과 동시에 챙기기 어려운 '작품'에 도전하는 이들을 볼때면 속이 저릿한 감동을 느낍니다.
그리고 그러한 '작품'을 대중성마저 고려한 체 완성한 이들을 보면 빠져들어 몇달은 그 속에서 허우적대곤 합니다. 최근엔 '아케인'이 그랬습니다.
25일, 엘든링이 발매됩니다.
제게 삶의 목적을 부여해준 게임을 만든 감독이 이제는 사장이 되었습니다.
그리고 그 사람이 존경하는 작가가 써준 설정으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.
기대가 안된다면 이상한 상황이지요.
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.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끓어오릅니다.